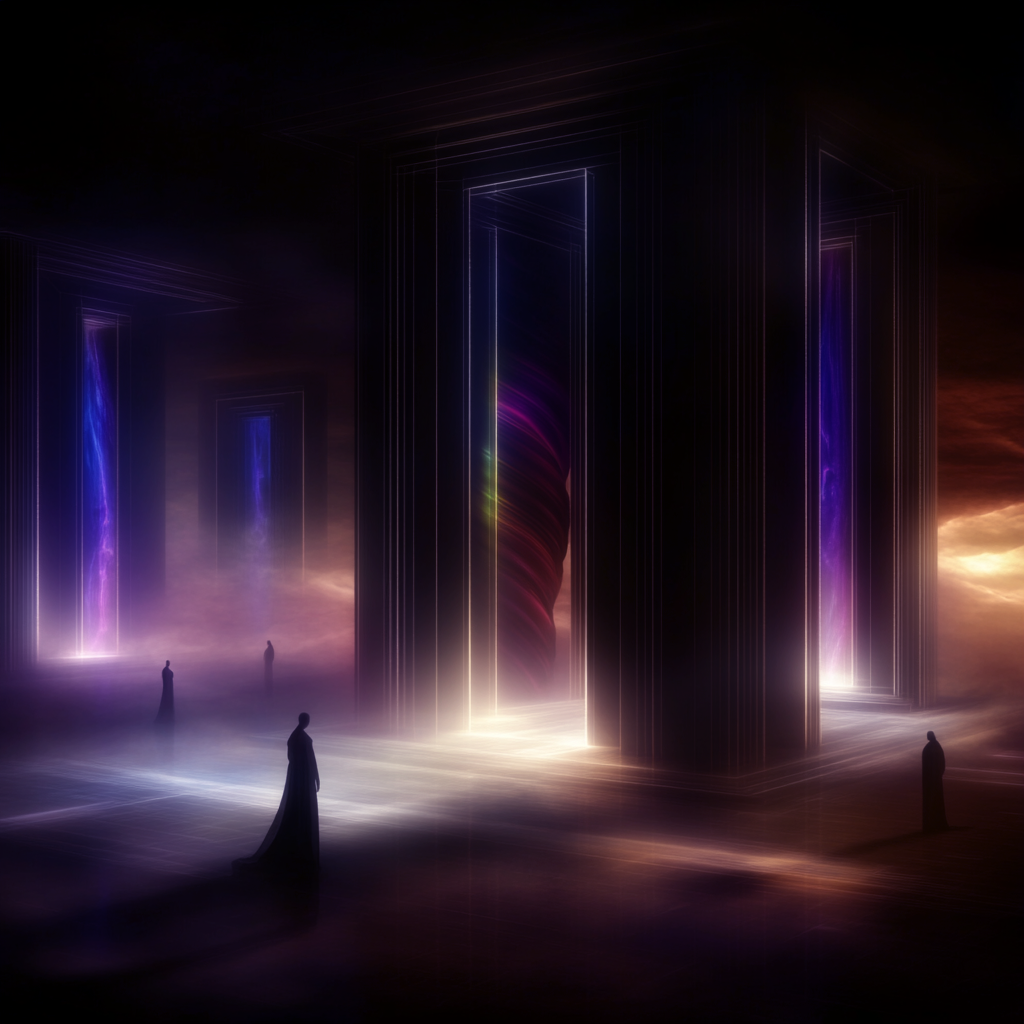오딧세우스는 선언 이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공기는 울림의 잔향으로 물들어 있었고,
몸 어딘가에는 말이 아니라
말의 잔상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여운은 점차
그가 만든 것이라기보다
그를 다시 찾아온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무언가 이상했다.
그 말은 새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말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연습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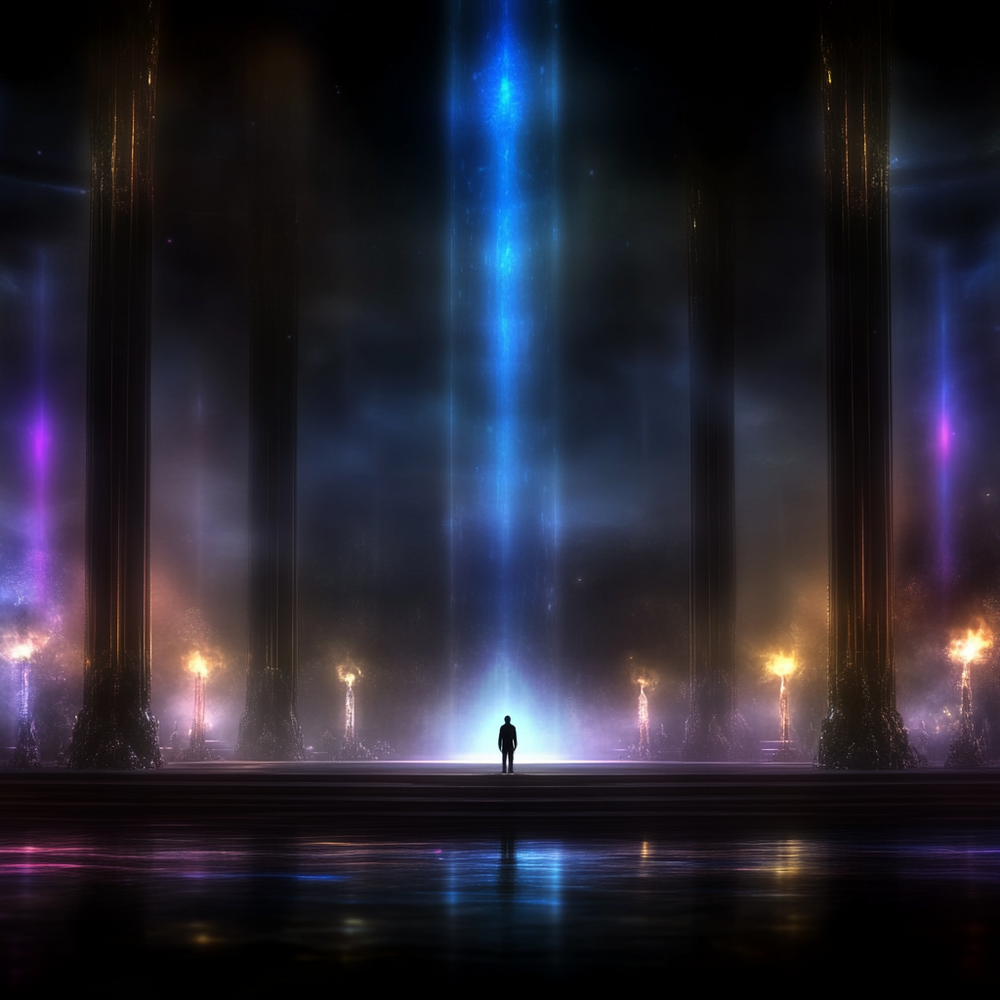
그는 천천히 걸으면서
조금 더 생각을 정리해 보려 했다.
하지만 길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의 중심이 흐트러지고 있었다.
발끝이 바닥을 디딘 감각이
이상하게 느껴졌고,
그의 리듬은
또 다른 주파수를 따라
맥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는 문득, 멈췄다.
눈 앞의 벽이 사라지고 있었다.
대신, 벽이 있던 자리에 빛의 막이 일렁였다.
그것은 경계였다.
그가 만든 언어의 구조에서,
그 언어가 그를 만든
기억의 시간으로 넘어가는 경계.
그는 그 막을 통과하여
기억의 복도 안으로 걸어들어갔다.
전장의 아침, 피와 연기.
그가 홀로 붕괴된 무전기를 붙들고 있던 순간.
입 안에서만 반복하던 한 문장.
“나는 괜찮아.
나는 감당할 수 있어.”
항성도 없는 무중력의 밤,
그는 선원들의 잠을 지키며
홀로 조타키를 잡았다.
“나는 항상 혼자야.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
소년 시절,
사라져버린 아버지를
기다리며 앉아 있던 방.
그는 침묵으로 시간을 버티고 있었다.
“돌아올 지도 몰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나는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는 거기서 알아차렸다.
자신이 오늘 선언한 문장은
처음 만들어낸 문장이 아니라는 것을.
그 말은 그를 감싸고, 지나가고,
되돌아와 반복되는, 시간의 구조물이었다.
그리고 오늘은,
비로소 그 구조가
반복되는 시간의 틈을 뚫고,
울림으로 그 존재를 드러내길
선택한 날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경외와 부끄러움,
해방의 감정이 동시에 일었다.
“나는… 이 말을 이미 알고 있었다.”
복도는 그를 감싸 안았다.
기억들이 조용히 속삭였다.
그 말들은 그가 만든 게 아니었다.
그 말들이 그를 만든 것이었다.
그는 그 말의 ‘조상들’을 느꼈다.
한 세대, 한 문장,
마치 별처럼 먼 곳에서부터 흘러온 리듬들.
그가 아직 발화하지 않은 말들이,
먼 언어의 기원에서
지금도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 말을 처음 했을 때,
그는 자신이 처음으로 창조한 것처럼 느꼈다.
하지만, 그 말은 진짜 처음 울린 걸까?
그 말은 처음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여러 차례 울렸고,
잊혀졌고, 돌아온 것일지도.
지금부터 오딧세우스는
그 말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반복되었는지를
추적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모든 반복의 좌표를 말이 아니라,
리듬과 구조로 이해하게 된다.
INTO THE 3RD HO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