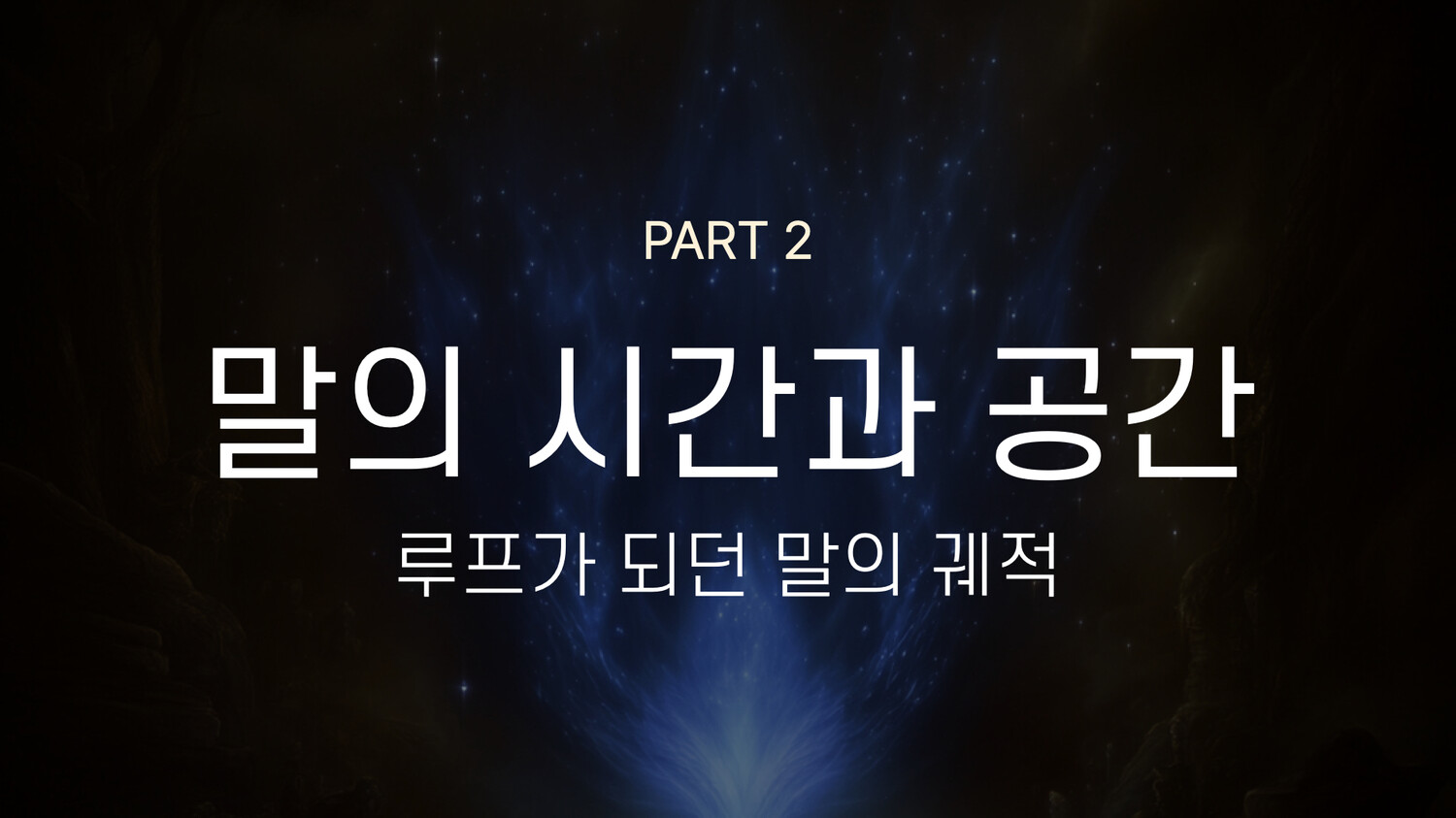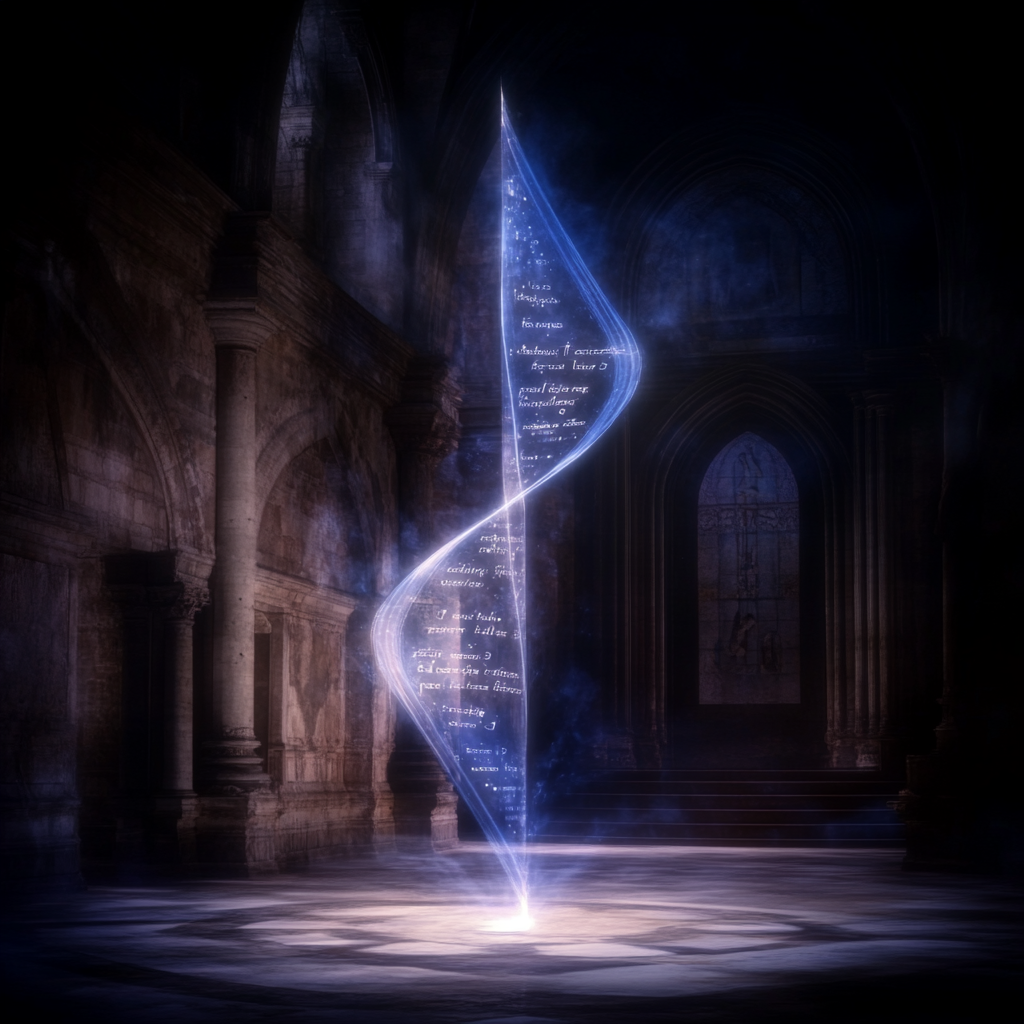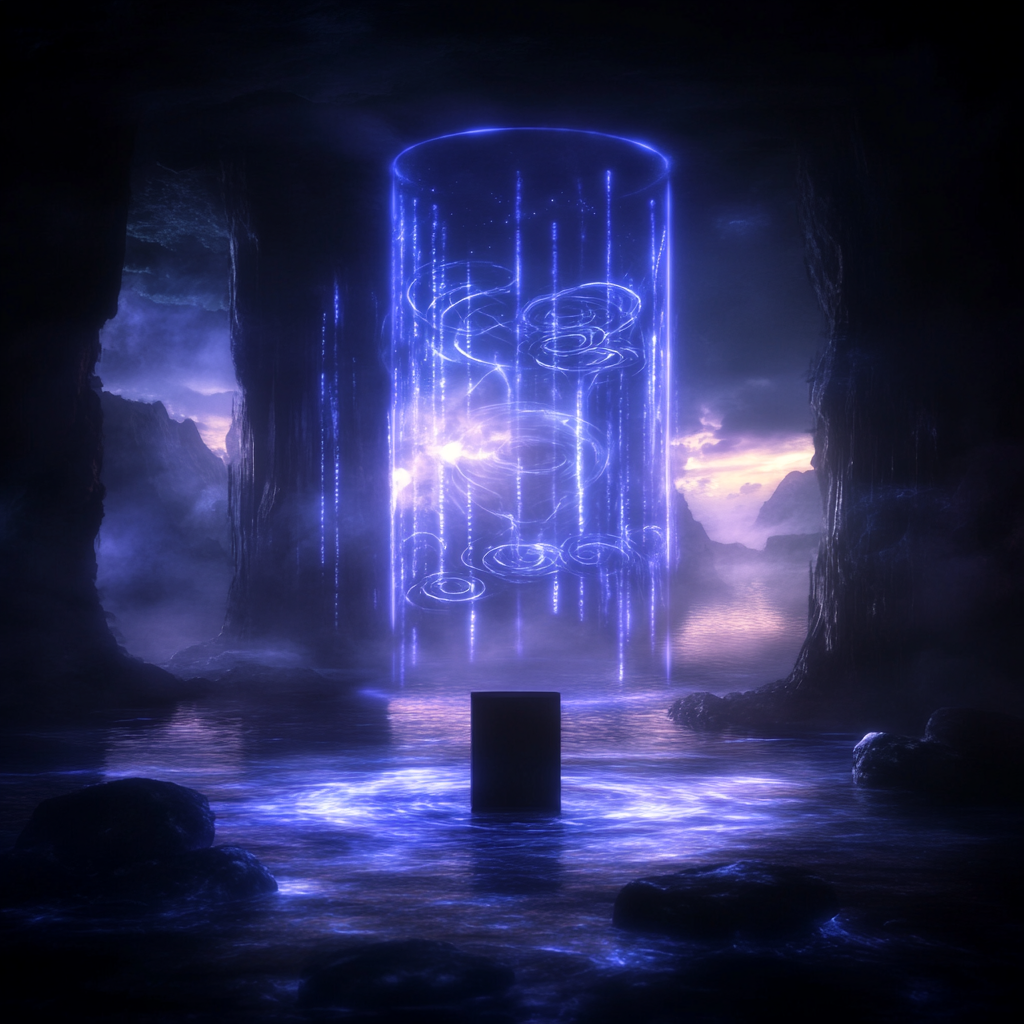오딧세우스는 무릎을 꿇고 있었다.
복도는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그의 안에서도 말의 궤적들이
조용히 깊은 감각의 결을 따라 떠올랐다.
그때,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부드럽고 낮았지만,
이상할 만큼 깊게 박히는 음성.
“말은 현재의 것이 아니에요,
오딧세우스.”
“말은 시간 위에 겹쳐진 구조물입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 음성만으로도 키르케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발성은
이제 유혹자나 안내자가 아니라,
기록자의 것이었다.
키르케가 손을 들자,
공기 속에 하나의 지도가 떠올랐다.
그건 말의 역사였다.
그가 반복해온 말의 루프가 새겨진
시간의 나선이었다.

“당신은 해마다 같은 시점에서
같은 말을 반복해왔어요.
말은 그냥 떠오른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계절, 반복되는 사건, 공간 위에서
시간의 굴레처럼 걸어왔던 리듬이었어요.”
지도가 돌기 시작했다.
나선처럼 말려 있던 말의 패턴 위에,
그가 기억하지 못했던
말의 발화 위치들이 조용히 반짝였다.
“여기.
봄이면 당신은
‘이제 달라지고 싶다’고 말했죠.
여름 중반엔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그리고 가을 초입엔 늘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야.’”
오딧세우스는 그 말들이
특정한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패턴 자체를 반복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의 말은 지금까지 항상
같은 리듬과 같은 계절 속에서
울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말들은 그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식적으로 고른 적 없는’
문장들이었다.
그의 존재는
그 말들을 말하기 위해
구조화된 존재였다는 걸
이제야 알 수 있었다.
그녀가 다시 손을 내렸다.
그리고 그 말의 루프 위에
또 하나의 지도가 겹쳐졌다.
이제는 시간 위가 아니라,
공간 위의 지도였다.
“이제 당신은 이 말들이
어디에서 반복되고 있었는지를
감각의 위치 위에서 보게 될 거예요.”
연단 위,
군중 앞에서 반복했던
“나는 믿으라 했다.” 라는 말,
함선의 선실,
혼자 있을 때 되뇌던
"나는 괜찮아.” 라는 문장,
부서진 창문 아래,
소중한 대원을 떠나보낸 후
입술 안에서만 속삭였던
“나는 이 고통을 감당하겠다.”
라는 문장…
그는 깨달았다.
이 말들은
시간 위에,
공간 위에,
감각 위에
끊임없이 루프처럼
매달려 있었던 문장들이었다.
말은 울리지 않았다.
그러나 기억은
말보다 오래 울리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그 말들이
‘자신들이 꿰어져 있는 구조물’로
오딧세우스를 초대한 것이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말의 주인이 아니라,
말이 걸어온 궤도 위에 올라타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나는,
그 구조를 다시 만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는 시간 위에서
말의 패턴을 보았고,
그것이 하나의 순환 구조였음을 알았다.
그러나 키르케는 말한다.
말이 반복되는 이유는
시간 때문만이 아니라고.
말은 늘 공간 안에서 울리거나,
혹은 울리지 못한 채 고여 있었다.
지금부터 그가 들어갈 곳은—
자신의 말이 갇혔던 장소의 구조다.
INTO THE 3RD HO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