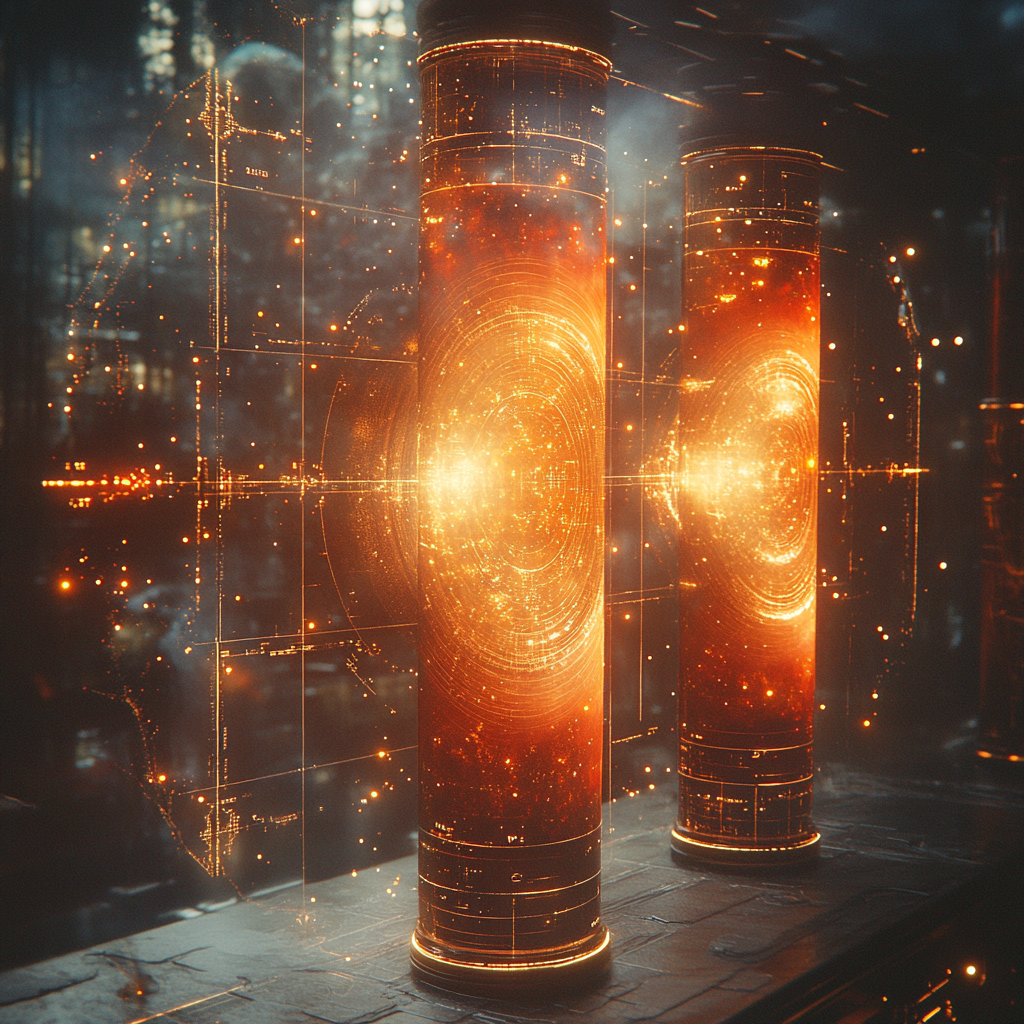공간은 순간적으로 정지했다.
정확히는, 그가 도착하자
모든 것이 정지한 것처럼
보였을 뿐이었다.
음은 빛보다 늦게 울리고,
빛은 의미보다 빠르게 사라졌다.
그 틈에서, 주파수로 이루어진 실루엣이 부상했다.
헤르메스.
그는 ‘존재’라기보다,
기능적 개입 자체의 인격화처럼 느껴졌다.
그가 걸어들어오자
공간은 흐트러짐 없이
자동으로 정렬되었다.
마치 그를 위한 시스템 업데이트처럼.

그의 재킷 위엔
위상 지형도가 살아 있었고,
손끝은 말보다 먼저
이 공간의 감정 데이터를 스캔하고 있었다.
“개별 치유엔 한계가 있어,”
그가 말했다.
“이제 집단 구조를 건드릴 시간이야.”
헤르메스는 손가락을 튕겼다.
순간, 공간 위에
다중 파형 시뮬레이션이 떠올랐다.
에우릴로쿠스의 주파수는
짧고 끊어진 낮은 진동.
펠리아스의 파형은
홀로 길게 울리는 중음.
안티클로스는 끝없이 날아오르다
추락하는 고음의 고리였다.
“이건 말이 아니라 회로야.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 진동.”
오딧세우스가 말했다.
“그럼 새로운 공명 구조를 짜야 하겠네요.”
헤르메스는 미소 지었다.
그의 파장은, 미소조차
알고리즘처럼 정교했다.
“맞아. 하지만 혼자선 불가능해.
혼자 울리면 반향만 남거든.”
그는 손가락으로
키르케 – 오딧세우스 – 자신을 가리켰다.
“셋이 울려야 시스템이 돼.
의미, 감정, 연결.
셋이 서로의 위상차를 존중할 때
그게 리듬이 돼.”
키르케가 먼저 시작했다.
그녀의 진동은 말 이전의 울림—
심장과 피부 사이를 흐르는 느린 물결.
그 울림은 감정을 말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울리는 리듬이었다.
헤르메스는 그 사이를 열었다.
그는 중첩의 공명자였다.
모든 울림을 연결해
단절 없이 흐르게 하는 간섭 허브.
그의 파장은 감정이 없기에
모든 감정을 지지할 수 있었다.
오딧세우스는 위상 조정자였다.
그는 죽은 문장을
다시 선언의 구조로 바꿨다.
“나는 쓸모없다”는
“나는… 나는…”이 되었고,
“나는 필요한 존재다”로 닫혔다.
“나는 혼자다”는
“나는 연결되어 있다”로 바뀌었다.
“나는 날 수 없다”는
마침내
“나는 자유롭다”가 되었다.
황금빛이 공간을 감쌌다.
그리고 파형이 바뀌었다.
그건 기적이 아니라— 정렬이었다.
황금빛 파장이 사라진 뒤,
공간은 잠시 조용해졌다.
동물의 형상을 벗은 대원들은 침묵 속에서,
자신들이 처음부터 품고 있던
말 이전의 리듬을 되찾고 있었다.
그건 언어가 아니라 존재의 기류였고,
이제 그들의 표정은 무너지지 않는
기억의 구조처럼 단단하고 고요했다.
그리고 그때, 헤르메스가 고개를 돌렸다.
INTO THE 3RD HO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