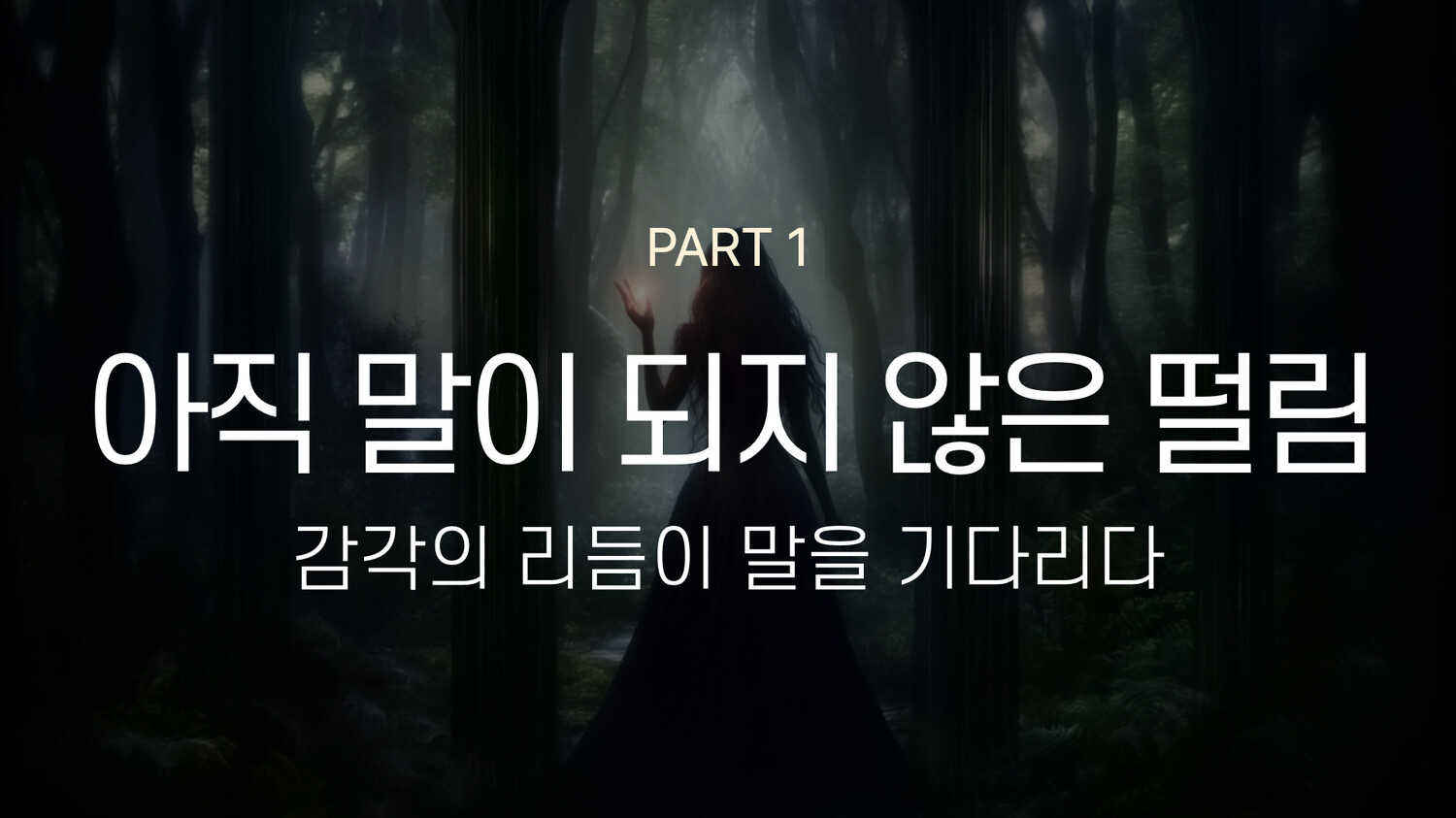아이아이아의 밤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자신의 안쪽이 울리는 것 같았다.
공기는 정지한 듯 했고,
별빛은 물속에서처럼
하늘에 번진 채 멈춰 있었다.
바람은 없었지만
그의 옷깃은 아주 가볍게 떨렸다.
이 밤 안의 오딧세우스는
느리게, 조심스럽게 걸었다.
그의 발 아래
작은 모래 알갱이들조차
그의 리듬에 맞춰 바스락거렸다.
그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자신의 가슴 아래에 흐르는 이 감각은
일반적인 ‘감정’이 아니었다.
그건…
입을 열기 전의 압력,
말이 되지 못한 울림,
입술 안쪽에 고여 있던, 오래된 떨림.

그리고 그는
자신이 '불려왔다'는 것을
명확히 느꼈다.
이 감각에 닿을 수 있는 존재가
자신뿐이라는 사실.
그건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경외의 감정으로 다가왔다.
지구에서, 그 누구도
이 감각에 대해 말해 준 적 없었다.
이 진동을, 그 누구도
언어로 가르쳐주지 못했다.
그 순간 지구의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이 스쳐갔다.
그리고 사라졌다.
그는 알았다.
지금 그 누구도 도달한 적 없는 감각에
자신은 들어와 있었다.

그의 심장 안쪽,
마치 꿀빛으로 늘어진 막 같은
무언가가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아직 말이 되지 않은 채,
한 문장을 기다리며
형체도 의미도 없이 울렸다.
‘나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그는 자문했지만,
실은 아직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말 이전의 앎에 있었다.
이건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직 말이 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의 시야가 조금만 기울면,
감정도 따라 움직였다.
자신이 보는 풍경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무언가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다.
매번 자신의 어딘가에
감각이 닿을 때마다,
알 수 없는 울컥임이 올라왔다.
감정이라고 부르기엔 뭔가 다르지만,
그건 분명히 그의 생각 결에 진동을 남기며,
흐름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다.
그는 이제야 자기 안에서
말이 생겨나는 장소를 느끼고 있었다.
궁전의 심장부에 다다랐을 때,
그곳엔 키르케가 있었다.
그녀는 투명한 옷을 입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이제 그를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읽고’ 있었다.
조금 더 깊이, 섬세하게.
그녀의 눈빛이 닿았을 때,
그는 잠깐 숨을 골랐다.
그의 안에 발생한
자신도 정체를 아직 잘 모르는 떨림이
그녀에게 느껴질 것 같아서.
이 느낌은 아직까지는
자신만 간직하길 바랐다.
“당신 안에서
지금 울려 퍼지는 말은
무엇인가요?”
그의 마음을 아는지,
그의 울림이 닿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말은 대답을 위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건, 그의 안쪽에서 떨리는 파형에
귀를 기울이는 방식이었다.
그는 아직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해했다.
그의 말이
지금 막 태어나는 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숨기고 싶어하는,
새로 태어난 작은 진동도.
키르케는 손을 내밀었다.
“지금부터, 그 울림이
구조가 되기 위한 방으로 가요.”
그의 안에서 떨리던 그 감각은
더 이상 무형으로 남아 있지 않았다.
입 밖으로 내기 전의 말.
울림이 단어가 되기 직전의
가장 얇은 경계.
오딧세우스는 느꼈다.
이제 그 진동이,
자신의 언어가 될 준비를 마쳤다.
지금, 그가 해야 할 일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고
말로 이끄는 것.
키르케는 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그를 데려갈 곳은—
말이 처음 태어나는 방이었다.
INTO THE 3RD HO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