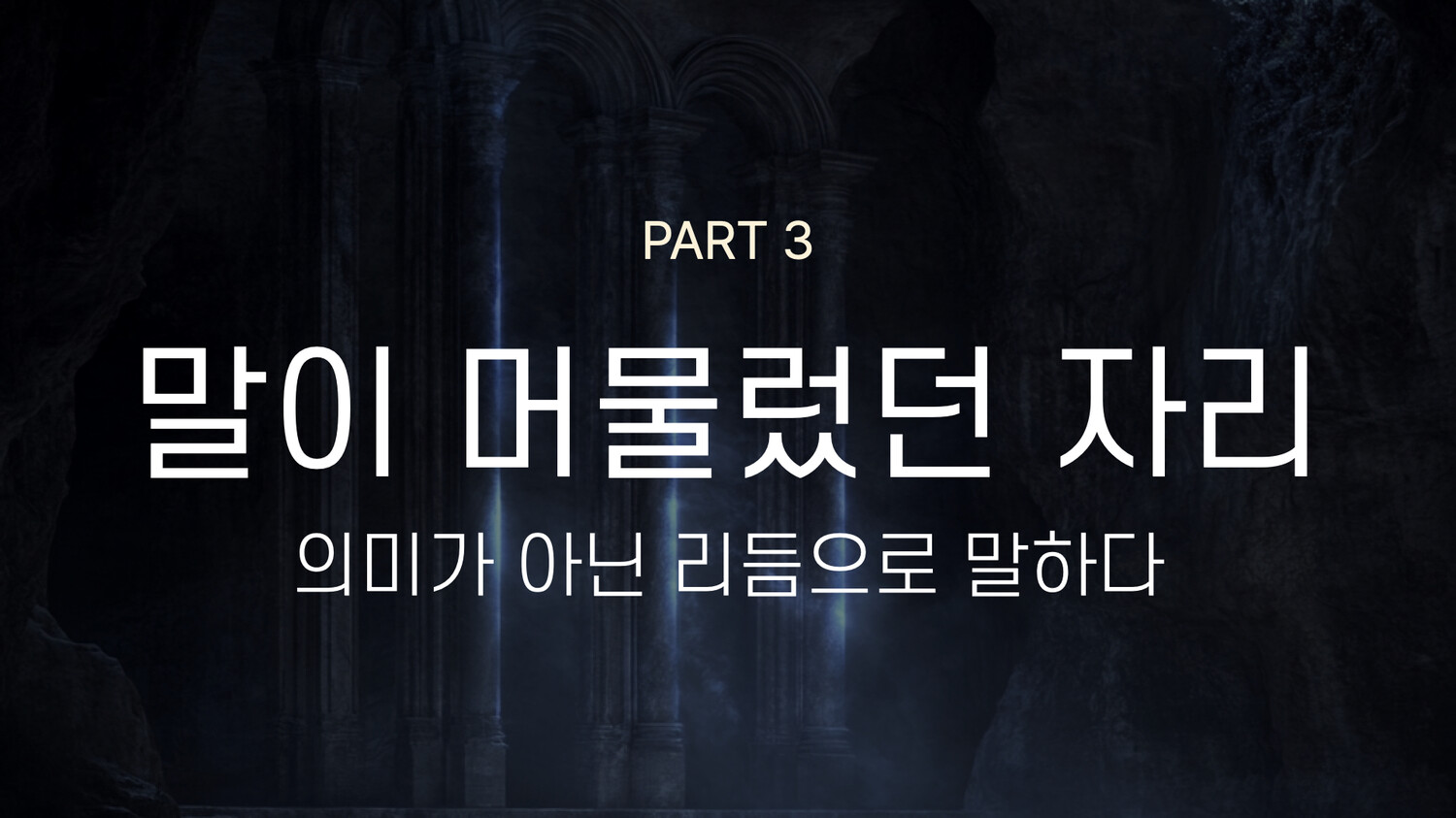오딧세우스는
시간의 나선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그의 손끝에 닿는 빛은
기억이라기보다,
고체화된 침묵 같았다.
말은 이미 울린 적 있었지만,
그 말이 머물렀던 자리엔
무언가 아직도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빛의 층이 또 하나 열렸다.

이제 시간은 멈추고,
공간의 결이 지층처럼 펼쳐졌다.
빛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로
가로지르듯 이어졌다.
“이건 당신의 말이
반복되었던 장소의 구조예요.”
키르케의 목소리는
더 조용해졌지만,
이상하게도 더 깊게 파고들었다.
“시간이 말의 리듬을
반복시켰다면,
공간은 그 리듬이 고여
머무르던 그릇이었어요.”
말은 기억이 아니라,
지형의 패턴이었다.
빛의 지도는
뒤집히듯 회전했고,
그는 눈을 감았다.
그의 입술에서
아주 익숙한 문장이 떠올랐다.
“나는 감당할 수 있어.”
그 문장은 이제 한 공간 안에서
울리는 장면으로 떠올랐다.
무중력의 조타실.
별이 흩뿌려진 바다같은
우주를 항해하던 시간,
하지만 고독감에 목이 메이던 그 곳.
그 말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의 내부에서만 맴돌았다.
또 다른 말.
“나는 괜찮아.”
그건 붕괴된 건물 잔해 위에서
살아남은 자로서 한 말이었다.
하지만 그 공간 역시—
스스로를 울릴 수 없던 장소였다.
그 말은 위로의 형식을 가졌지만,
그 말의 진심은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다.
그는 다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오래 전
잊었던 공간 하나를 떠올렸다.
소년 시절,
아버지를 기다리며 웅크렸던,
좁은 서재 구석.
그곳에서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문장을
속으로 꺼내보았다.
“나는 불러도 대답 받지 못할 사람이다.”
그 문장은, 그 방에 고여 있었다.
이제 그는 그것을 본다.
자신의 말이 울리지 못하고
퇴적되었던 모든 장소들.
그 말은 고여 있었고,
켜켜이 쌓여 있었고,
그 공간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오딧세우스는 눈을 떴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말은 언제 반복되었느냐보다,
어디서 울리지 못했느냐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그 공간 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그 말의 울림에 공명할 준비를 했다.
이번엔…
울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더 이상
의미나 전략이 아니었다.
그 말은 울렸다.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말은 감정을 표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존재의 리듬이 지닌 방향이라는 것을.
그는 더 이상, 말을 통해
과거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 그는 말을 통해
미래를 짜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의 발 아래 땅이
아주 천천히 진동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 말은, 누군가를 울리러 간다.
INTO THE 3RD HOLE